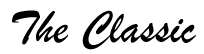이 세상에 없는 호랑이 버터
종종 밑도 끝도 없이 도쿄와 스톡홀름이 그리울 때가 있다. 흔히 향수라 부르는 감정일까, 물론 누군가는 비웃을 것이다. "거 뭐 얼마나 살았다고 향수는...유난 떨고 앉았네" 하고 말이다. 그래도 동조해주는 사람도 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하며 "1년 밖에 안 있어서 좀 웃기지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은 "공감해요, 전 반 년 살았는데도 그렇거든요" 라고 해서 무척 반가웠던 기억이 난다. 그리움의 크기는 실제 시간의 길이와 꼭 정비례하는건 아닐지도 모르겠다.
향수 혹은 노스탤지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고향을 몹시 그리워하는 마음, 또는 지난 시절에 대한 그리움".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왠지 부족한 느낌이 든다. 심지어 경험한 적도 없는 이미지에 향수를 느끼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 읽었던 명작 동화에 나오는 영국식 기숙 학교나, 말만 들어도 그 이미지가 머릿속에 자동 재생 되는 일본의 여름 - 즉 내려쬐는 뙤약볕 아래 마루에 앉아 선풍기 바람을 쐬며 "가리가리쿤"을 한입 베어무는 장면은 대개는 경험한 적 없지만 많은 사람에게 그리움을 자아내는 대표적인 장면 아닐까. 일본의 버블이 한창이던 시절 찍었다는 코카콜라 광고 역시 비슷한 느낌을 준다. 이런걸 보면 향수가 단지 개인의 경험으로만 생기는건 아닌 듯하다.
또 향수는 단편적인 감각이 아니라 공감각의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음식에서 더욱 강렬한 효과를 준다. 장소에서 느끼는 향수는 최소한 미각은 자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미식견문록旅行者の朝食>에서 저자 요네하라 마리는 어린 시절 딱 한 번 먹었던 과자 "할바"의 맛을 잊지 못해 평생 찾아다닌다. 그런데 심지어 음식 역시 꼭 먹어봤어야만 향수가 생기는건 또 아니다. "소금에 절인 라임"이라든가 각종 과일이 든 파이 등은 어린 시절 그저 환상 속에만 존재하는 음식이었지만 여전히 그리움의 대상이기도 하니까 말이다.
어쩌면 실제로 맛을 모르기 때문에 더욱 맛있을 거라고 과장하여 생각하게 되는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든다. 이제는 흔한 홍차와 마들렌이지만 아주 오래 전 크라운 베이커리가 동네 빵집을 통일하기도 전인 춘추전국시대에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읽었다면, 분명 실제 마들렌보다 훨씬 더 맛있는 음식이라고 여겼을 법하다. "과거는 미화되기 마련이다" 나는 이 말을 결국 실제 경험보다도 오히려 상상력이 더 큰 지분을 갖는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그래서인지 나는 궁극의 버터인 "호랑이 버터"가 그립다. <꼬마 삼보 이야기>에서 나무를 빙빙 돌던 호랑이들이 녹아서 되었다는 버터 말이다. 따지고 들자면 잔인한 음식이지만 어린 시절 이 이야기를 읽고서는 호랑이 버터의 맛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래서일까 어른이 된 지금에도 여전히 그립다, 마치 언젠가 실제로 맛 본 것처럼. 실재하는 다른 음식과 달리 이전에 경험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 맛 볼 수 없는 음식인데도 그리움의 크기가 그 무엇보다 크니 역시나 향수란 상상력에 더 크게 의존하는건 아닐까. 미디어의 발달로 경험의 크기는 커졌지만 오히려 상상력은 축소되는 듯한 요즘 나는 여전히 호랑이 버터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 세상에 없는 호랑이 버터를.